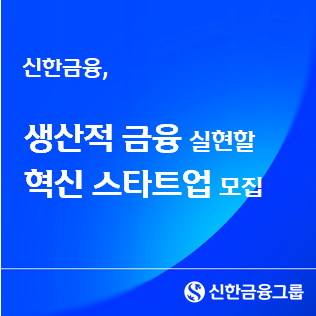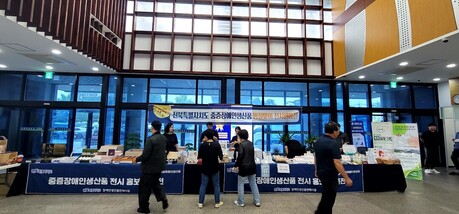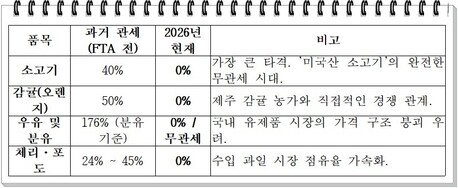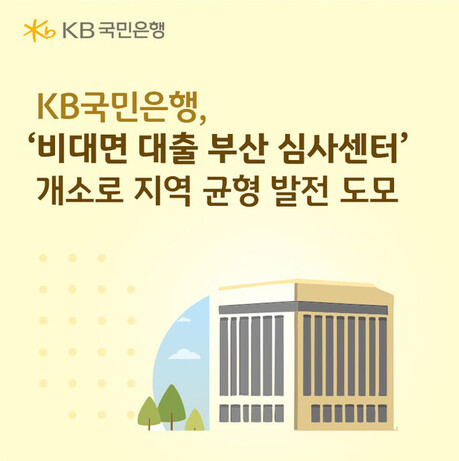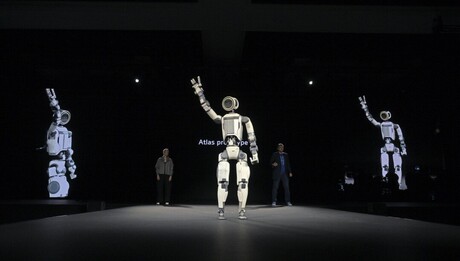발산역 맛집 <똑순이아구찜> 백옥자 대표는 신혼 초에 시댁 식구가 운영했던 광주광역시의 아귀찜 식당에서 조리법을 배웠다. 은행원인 남편과 서울에 살면서 부업삼아 시댁 식당 스타일로 아귀찜 전문점을 개업한지도 20년 가까이 됐다. 해마다 1월에 잡은 최상품 아귀만 저장했다가 사용해 육질이 연하다. 그 맛에 단골손님 발길이 한결같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하고 달라졌다. 20년 전엔 매출의 70% 정도는 대(大)자였는데 요즘은 2인분(3만9000원)이 주로 나간다. 고객층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가정주부들이 대세였는데 지금은 젊은 연인들이 단연 눈에 띈다. 밤 10까지 손님들이 북적였던 예전에 비해 지금은 저녁 8시 30분이면 동네가 한산해진 것도 달라진 풍경이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다. 백 대표와 직원들과의 끈끈한 관계다. 백 대표는 ‘솔선수범 사장님’으로 알려져 있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이 있다. 직원들 역시 일당백의 인재들로 알려졌다. 발산역 맛집 <똑순이아구찜>이 위치한 마곡지구에는 식당이 수없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겉보기와 달리 식당 운영하기에 만만치 않은 상권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똑순이아구찜>만은 꿋꿋이 대박집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백 대표는 직원들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똑순이아구찜> 직원들의 맨 파워를 부러워하는 식당 주인들은 백 대표 리더십과 인력관리의 비결을 궁금해 한다. 백 대표는 직원 선발기준에서 능력과 품성,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품성 쪽을 택한다. 거기엔 백 대표의 음식철학이 숨어있다. ‘화난 사람이 만든 음식은 독’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식당에서 손님에게 ‘독’을 팔 수는 없다는 것. 부부싸움하고 출근한 주방 직원은 그날 쉬게 할 정도로 음식 만드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중시한다.
“좋은 사람과 일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요. 제가 특별히 사람 뽑는 재주가 뛰어난 건 아닙니다. 다른 직군은 몰라도 우리 식당에서 ‘착한 사람’을 선발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당장은 능력이 부족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그런 분들이 더 기여도가 높습니다.”

10년 근속 직원, 플래카드 내걸고 다함께 축하해주는 식당
좋은 인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백 대표는 인재를 선발하고 키우는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자신이 단지 인복이 많았다고 한다. 정말 노력하지 않아도 양질의 인력들이 저절로 모여들고 오래 이탈하지 않을까? 취재 과정에서 이 식당의 한 직원은 불과 6개월 전에 모 식당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음을 고백했다. 분명 그들이 백 대표 곁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백 대표는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할까? 여기서 ‘관리’라는 단어는 사실 어폐가 있다. 경영학적으로는 적확한 용어일 테지만 <똑순이아구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백 대표는 직원들이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소중한 배우자임을 늘 상기한다. 직원이 뭔가 실수해서 주의를 줄 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평소 직원 흉도 안 본다. 마치 남 앞에서 내 자식 흉보지 않는 것처럼. 직원들을 자식 챙기듯 하는 그의 습관은 외식업계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식당 대표들 모임이나 벤치마킹을 다닐 때면 백 대표는 뭔가 손에 들고 다닌다. 직원들 먹일 음식이다. 다니면서 좀 맛있거나 특별한 음식을 발견하면 챙겼다가 직원들에게 먹인다. 명절이나 경조사를 챙기는 건 기본이다. 그런 백 대표에게 가장 속상한 순간은 직원이 손님에게 야단을 맞을 때다. “직원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프기 때문”이다. 백 대표 직원관리의 핵심은 직원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었다.
지금 <똑순이아구찜> 직원 중 네댓 명은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다. 백 대표는 직원들이 10년 근속을 맞이할 때마다 식당에 플래카드를 내건다. 함께 축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다. 이런 직원들에게 간섭이나 통제는 의미가 없다. 이들은 일종의 주인정신을 갖고 있다.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알아서 일한다. 백 대표와 직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런 존재로 규정한다.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지요!”
한밤중이면 식당에 나타나는 술 한 잔의 미스터리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온 어느 날 백 대표는 식당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 다시 되돌아갔다.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한쪽 벽면에 술을 가득 부은 술잔이 놓여있었다. 한눈에 봐도 정갈했다. 마치 옛날 어머니들이 장독대에 떠놓은 새벽 정화수 같았다. 누군가 치성을 드렸음을 직감했다. 이상해서 다음날 밤에 가봤더니 역시 또 술잔이 깔끔하게 놓여있었다. 누굴까?
범인(?)은 곧 밝혀졌다. 조리실장 박송자 씨였다. 입사한지 17년이 넘은 고참이다. 알고 보니 박 실장에겐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조리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퇴근하면서 박 실장은 식당 한 쪽에 맑은 술 한 잔을 정성껏 따라 올렸다. 다음날 제일 먼저 출근해 전날 밤의 술잔을 치우곤 했던 것이다. 남몰래 술잔을 올리며 그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이 식당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식당 사람들 무탈하게 해주옵소서!’하고. 명절이나 식당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정성을 들였다. 박 실장에게 술을 바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터줏대감이든 칠성님이든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이고 정성일 뿐.
박 실장은 외딴 섬 출신이다. 시골 사람 특유의 소박한 순수가 느껴진다. 문명으로 오염되기 전 맑은 영혼을 간직했던 인디언을 떠올리게 한다. 간혹 이런 모습을 미신이라며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편견이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망을 빈 것이다. 기성 종교 사제들이 거룩한 제단에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나는 타인을 위해 촛불 밝혀본 적, 물 한 잔 바쳐본 적 있었던가, 자문하게 된다. 누군가 나를 위해 진심으로 빌어주는 타인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만이라도 존재한다면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백옥자 대표가 부러워진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