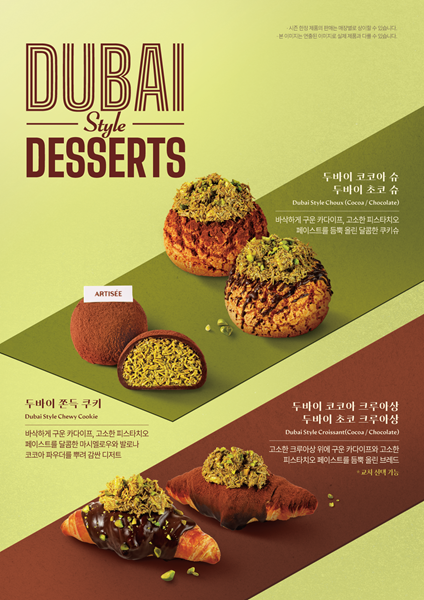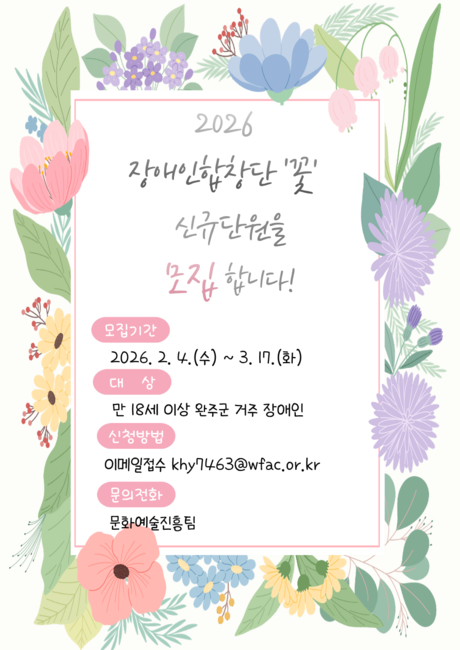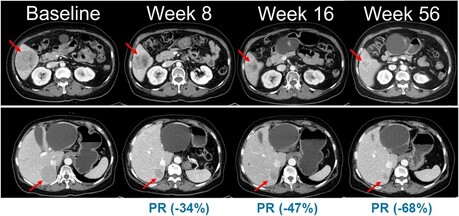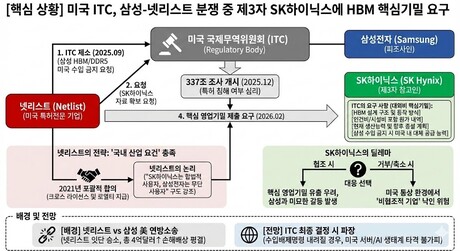가격 인하 압력·고용량 변수 속 '마진 방어력' 시험대
[HBN뉴스 = 이동훈 기자]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주’를 둘러싼 글로벌 특허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삼일제약의 안과 사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혔다는 평가가 제약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13조원 규모의 ‘아일리아’ 시장을 둘러싼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특허 리스크 해소가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일제약은 19일 아필리부주 관련 글로벌 특허 합의 계약을 통해 해당 제품의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
| 아필리부주 [사진=삼일제약] |
아필리부주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이다. 개발은 삼성바이오에피스, 국내 유통·판매는 삼일제약이 맡고 있다.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는 미국에서 2024년 6월, 유럽에서는 2025년 5월에 만료됐다. 하지만 유효 성분에 대한 저용량 제품의 제형 특허가 미국과 EU 등에서 2027년 6월까지 유지되며 고용량 제품의 제형 특허는 2039년경 만료될 예정이다.
삼일제약은 지난해 초 리제네론 측과 특허 분쟁에 따른 가처분 인용으로 아필리부의 판매를 중단했지만, 같은 해 12월 법원의 판매금지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국내 유통을 재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월 30일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인 리제네론 및 바이엘과 미국·캐나다를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2mg 제형에 대한 특허 합의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특허 합의가 미국 시장까지 확대되면서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특허 합의는 판매 중단이나 소송 리스크를 줄여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특허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판매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의 의미는 적지 않다.
다만 업계에서는 합의 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로열티 구조나 판매 조건이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실적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대비 가격 경쟁력이 핵심이지만, 동시에 개발사와 유통사 간 수익 배분 구조에 따라 영업이익 기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일제약은 개발사가 아닌 국내 유통·판매를 담당하는 역할로 실제 영업이익 개선 여부는 국내 처방 확대 속도와 약가 정책, 마케팅 비용 관리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외 시장 환경도 녹록지 않다.
오리지널인 아일리아는 2024년 기준 약 95억달러(약 13조원)의 글로벌 매출을 기록한 대표적 안과 치료제다. 저용량(2mg) 물질 특허 만료 이후 바이오시밀러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시장 구도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국내외 다수 기업이 허가 및 특허 합의를 마치고 출시를 준비 중이며, 일부 기업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경쟁은 단순한 허가 단계가 아니라 실제 가격·점유율 경쟁 국면으로 진입한 셈이다.
여기에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대비 20~40% 낮은 가격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다. 복수의 제품이 동시 진입할 경우 가격 인하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공익적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동시에 판매사의 마진 구조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오리지널 개발사는 고용량(8mg) 제형을 전면에 내세워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량 제품은 투여 간격을 늘려 환자 편의성을 높였으며, 장기 특허 보호를 받고 있어 바이오시밀러 확산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경쟁 속에서 성패를 가르는 것은 ‘출시 여부’가 아니라 ‘마진 방어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